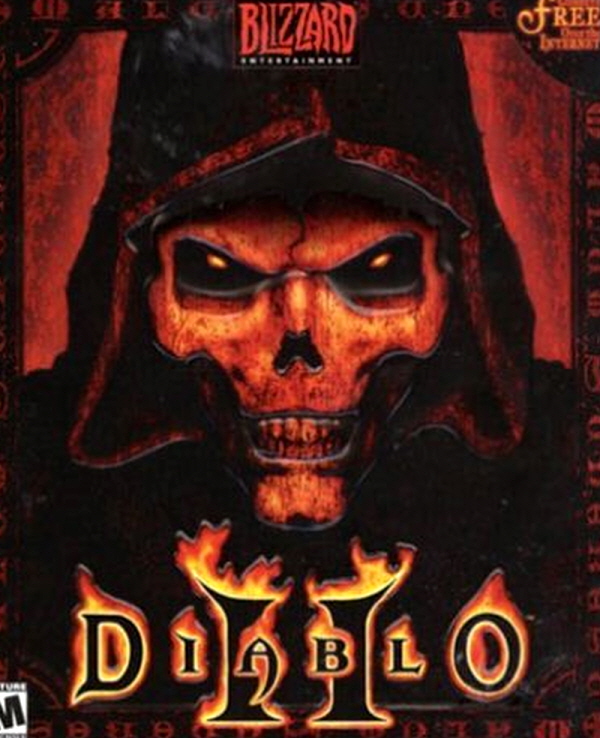
♨디아블로2와의 조우: 친구 집에서의 신세계 입문
이 대단한 게임의 존재를 친구집에 놀러갔을 때 처음 알았다. PC게임이라곤 컴퓨터를 살 때 깔려있었던 스타크래프트나 피파정도만 해봤던 터라 친구가 재밌게 하고 있었던 이 게임은 나에게 미지의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처음엔 그저 친구가 플레이하는 것을 구경하며 좀비처럼 넋놓고 있었던 것 같다.

▲ 첫인상은 "어둠의 게임"이었던 디아블로2
전반적으로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무섭게 생긴 몬스터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싱크로율 100%에 가까운 사운드까지(당시엔 그렇게 느꼈다).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도 나를 빨아들이게 하는 무언가가 이 게임에서 마구 느껴졌다. 특히나 몬스터를 잡았을 때 떨구던 휘황찬란한 장비들은 마치 나를 향해 '니가 나를 안하고 버틸 수 있을 거 같애!?'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 게임이 눈 앞에 아른거렸던 나는 그 친구에게 혹시 CD를 며칠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 친구도 무척 재밌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알았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유인즉슨 이 게임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자꾸 꿈 속에 나타나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돈 아닌 거 같은데...어쨌거나 그 덕에 운좋게 나는 그 CD를 받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냥 새롭게 겪는 자체 하나하나가 재밌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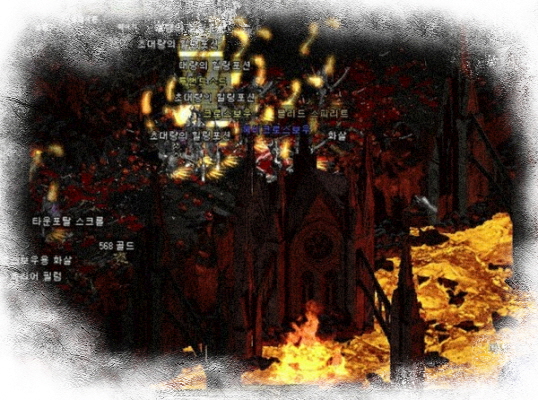
▲ 좋은 장비야 나와라!
초기엔 처음 겪어 보는 시스템이나 조작법 등으로 좀 적응이 필요했으나 게임 진행이 워낙 간결하고 복잡한 부분이 별로 없어 금새 적응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퀘스트를 받고 더디지만 하나 하나 완료하면서 진행하는 것 자체도 재밌었지만 특히나 재밌었던 부분은 몬스터를 잡으면서 나오는 장비를 주워 입는 것과 동시에 점점 더 나은 장비로 바꿔나가는 부분이었다. 좋은 장비는 곧 내 캐릭터의 전투력으로 이어지기에 쓸만한 장비 하나를 주웠을 때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고작 "매직"아이템을 스크롤로 확인하는데도 떨리는 마음이었으니 그 당시 얼마나 순수하게 즐겼는지를 알 수 있다.
죽고 또 죽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 초보 게이머는 드디어 디아블로를 공략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게임에 난이도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노멀 난이도는 그저 워밍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나이트매어" 난이도가 나에게 시련을 가져줄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이트매어의 시작: 악몽 그리고 또다른 재미
'디아블로도 잡아봤겠다, 난이도가 좀 오른다고 얼마나 어렵겠어' 하는 생각으로 헛바람을 안고 시작한 나이트매어는 말 그대로 "악몽"과 같았다. 내 무기는 몬스터에게 깔짝 깔짝 대는 수준이었지만 몬스터의 공격은 그야말로 한방 한방이 치명타로 전해져왔다. 내게 몬스터 한마리 한마리가 "영화 나이트매어"의 꿈 속 살인마 "프레디"보다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다. 이 게임을 갓 시작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었다. 나이트매어 난이도를 갓 시작할 때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어디가고 어느새 "뜨내기 모험가"로 돌아와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시금 적응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워진 만큼 드롭되는 장비의 수준도 높아졌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캐릭터의 전투력도 슬슬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니 노멀난이도 때와는 비슷하면서 또다른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노멀 난이도는 한발 한발 내딛는 곳이 모두 초행길이라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나이트매어 난이도부터는 진정한 전사가 되기 위한 "수련"의 성격을 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이 게임이 자랑하던 "아이템파밍"의 진정한 재미를 얻기 시작하기도 했고 말이다.
♨멀티플레이: 신세계 입문2
나이트매어 난이도도 완전히 적응을 마칠즈음 내게 또다른 신세계가 펼쳐졌다. 그제서야 "멀티플레이"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저 싱글플레이에 빠져서 하다보니 이 게임도 스타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CD key"가 있으며 그것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 다른 유저와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다.
하나 흥미로운 건 내게 디아블로 CD를 빌려주었던 친구가 그 즈음에 다른 게임을 한다고 그냥 내게 줘버린 것이다. 예상치 못한 횡재를 한 것이다. 그때부터 디아블로 플레이의 제 2막, 멀티플레이가 열린다.
멀티플레이를 하려면 캐릭터를 새로 키워야 했는데 고민 끝에 "네크로맨서"를 선택했다. 해골 및 골렘을 소환해서 함께 싸우며 저주 같은 디버프를 사용하는 소환사 클래스였다. 컨트롤이 좀 미숙했던 나는 아무래도 소환수들이랑 같이 싸우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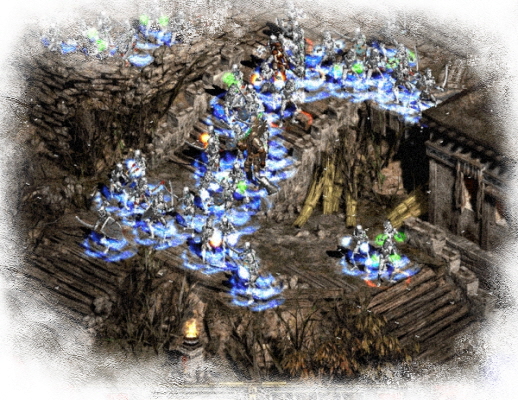
▲ 이런 식으로 해골을 떼거지로 소환해 몬스터들을 상대하곤 했었지
싱글플레이 때와는 또다른 재미가 당연히 멀티플레이에 있었다. 혼자서만 하다가 다른 유저들과 함께 퀘스트도 하고 보스도 잡고 하니 진작 멀티플레이의 존재를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자주 할 정도로 색다른 느낌이었다. 특히나 불쌍해보인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장비들을 선뜻 건네는 유저들도 꽤 있어 늦게나마 멀티플레이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했다.
![]() 분노포인트: 스킬 좀 잘못 찍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말이 돼!?
분노포인트: 스킬 좀 잘못 찍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멀티플레이 또한 재미나게 즐기며 나이트매어 난이도를 공략하고 헬 난이도까지 도전해 어느덧 60레벨 정도에 다다랐던 어느날, 충격을 받아 플레이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겪는다.
여느 날처럼 멀티플레이를 통해 어느 유저와 같이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휴식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 유저가 한마디한다.
"님 해골 소환하는 거 재밌어서 하는 거에요? 나중가면 전혀 쓸모가 없을 텐데..."
"네!? 꽤 쓸만한데요?"
"저 이 캐릭 스킬을 잘못 찍어서 다시 키우는 중인데 보니깐 님도 다시 키우는 게 좋을 텐데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냥 개성대로 키우는거죠 뭐."
그때는 그 유저의 조언을 애써 무시했다. 내 입장에선 60 레벨에 이른 것도 무척이나 힘들었고 대단한 일이라 새로 키운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게임진행 상 큰 어려움도 없는데 굳이 내 키우고 싶은대로 키운 캐릭터를 버린다는 건 나로써는 쓸데없는 일이기도 했다.

▲ 애증의 스킬트리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저가 해줬던 충고가 곧 현실이 되었다. 내가 애용했던 하위 티어에 있던 해골 및 골렘이 점차 힘을 쓰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게다가 스킬포인트 자체도 그때 그때 일관성없이 이곳 저곳에 눈길이 가는 스킬에 찍어뒀던 터라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허약한 전투력으로 드러나게 된다. 허접한 초보의 막무가내식 육성이 결국 포텐(?)을 터트리고 만것이다.
요즘이야 스킬포인트 시스템이 있는 게임이라면 초기화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 원할 때 스킬을 재구성할 수 있지만 당시 디아블로2의 스킬포인트 시스템은 초기화 기능이 없었다. 단 한개의 포인트가 잘못 찍혔어도 유저가 불만족스럽다면 캐릭터를 새로 키우는 방법밖에 없었다.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점으로 봐도 이는 대단히 융통성 없고 비효율성의 극치를 달리는 방식이었다.
이에 내 캐릭터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 키울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 순간의 나는 "분노, 탄식, 좌절"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겨우 스킬포인트 몇 개(솔직히 단 몇 개는 아니지만...)를 잘못찍었다고 애정을 쏟으며 나름 오랜 기간 키워왔던 캐릭터를 버려야 한다니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준비가 꽤 많이 필요했던 기억이 난다.
♨트라우마!?
결국 반강제로 다시 키우게 됐지만 그래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적잖은 경험을 한 덕분에 처음할 때보다는 확실히 육성이 무난했던 것 같다. 나름 여유도 생기고 말이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한가지 결벽증 아닌 결벽증이 생겼다. 스킬포인트를 찍을 때 대단히 신중해진 것이다. 타 게임을 할 때도 영향을 끼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당장 필요해도 나중엔 별로 안 쓸 것 같은 스킬은 과감하게 포기해 게임 진행이 많이 더뎌지는 경우도 잦았을 정도로 그게 뭐라고 스킬포인트를 찍을 땐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스킬초기화가 밥먹듯이 쉬워진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쭉 그랬던 것 같다. 아니 지금도 가끔 쓸데없이 그러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심했었나보다.
♨이만큼 강렬했던 게임이 얼마나 됐던가?
그 이후로 한 2~3년 가량 즐긴 것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즐겼던 기간과 관계없이 이 게임은 내 게임 인생에서 가장 큰 추억 및 재미를 줬던 게임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만큼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고 겪었던 감정과 기억들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탓일 거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주 가끔씩 PC방에서 이 게임을 마주칠 때면 나도 모르게 무념무상으로 지긋이 쳐다보는 것은 그 때문일까?
<끝>









저는 오히려 스킬을 다시 찍을수 없었던게 블리자드의 한수라고 생각 합니다...
스킬 연구 때문이라도 이렇게 키워 보고 저렇게 키워 봐야 했기 때문이죠...